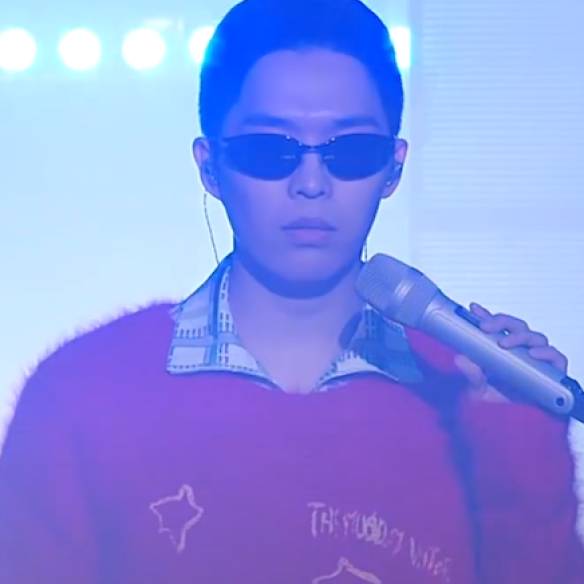LIFESTYLE
논알콜 맥주 좋아하세요?
술꾼도시여자가 되고픈 술찌도시여자의 논알코올 맥주 입문기.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술 권하는 사회>는 3·1 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과 일제 치하 지식인의 무기력을 다뤘지만 이 대목만큼은 올해 발표된 극사실주의 작품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다. 남편의 주절거림을 요약하자면 ‘사회가 나를 술 마시게 한다’는 것이리라. 문제는 이놈의 사회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술 마시게 한다는 점에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술 마시는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 술을 잘 마시면 ‘술꾼’이 되고 못 마시면 ‘술찌(술 찌질이)’ 혹은 ‘알쓰(알코올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와 꾼이라니 얼마나 극명한 신분 차이인가.
진정 술을 즐길 줄 아는 당신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한국인이고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아시안 플러시’ 증상을 갖고 있다면 40%의 확률로 ‘알쓰’일 수 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극동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알코올 분해효소인 ALDH 분비 능력이 60%에 불과하다. 한국 사람 열 명 중에 네 명은 선천적으로 술이 안 받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섯 명이 한 달에 한 번은 술을 마신다. 옆 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의 보고서에 의하면 도쿄에 거주하는 남성들 중 일주일에 4백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과음주 ‘술꾼’의 26%가 활성도가 낮은 ALDH 효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물 겨운 사회생활이다.
술 문화가 ‘빡세’기로 유명한 일간지 인턴 기자 시절이었다. 해가 지면 1차는 삼겹살집에서 소맥, 2차는 바에서 위스키, 3차는 민속주점에서 막걸리와 동동주를 섞어 마시고 동틀 무렵 회의실 책상에서 빨래처럼 포개져 자던 시절 한 선배가 별명을 지어줬다. ‘불가마’였다. 술을 마시면 정수리 가마까지 시뻘게진다는 이유였다. 약간 수치스러웠지만 동료들이 있어서 외롭진 않았다. ‘관악구 홍익인간’과 ‘서면 헬보이’가 함께였다.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시원하게 원샷 했고 몸은 비틀거릴지언정 온전한 정신(이라고 착각하며)으로 귀가했으며 다음 날 아이템 회의를 무탈하게 소화했다(고 믿었다). 전날 나라 잃은 백성처럼 술을 퍼 마시던 논설위원이 다음 날 상쾌한 얼굴로 명문을 쓰고 있었다.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다. 알코올 앞에선 결코 물러섬이 없었다. 그게 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치솟은 집값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뒤 자차 출퇴근을 시작하고 나는 알코올 앞에서 물러서기로 했다. 한 달치 월급을 대리비로 탕진할 수는 없지 않나. 나도 민망하다. 기름진 저녁식사, 화기애애한 대화,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잔을 거부하고 “저는 그냥 콜라 마실게요.”라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효과음이 들린다. 푸수슉. 맞다. 분위기 깨지는 소리다. 비슷한 처지의 경기도인에게 그 효과음이 어찌나 명징했는지 설명했는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논알코올 맥주를 마셔보라는 주문이었다. “콜라 짠, 하고 하이트 제로 짠, 하고 얼마나 술자리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알아?” 그 맛없는 걸 대안이라고 제시하다니 이 무슨 대방어철에 고래밥 먹는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기어코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일생일대의 선택을 앞두고 고뇌하는 지인 앞에서 어쩐지 “여기 사이다 한 병 더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어쩌면 치솟는 혈당 수치를 잠재우기 위한 무의식적 신체 반응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레스토랑엔 두 종류의 논알코올 맥주를 팔고 있었다. 에탄올 함유 0.03%의 비알코올 맥주 하이네켄 넌알콜릭과 에탄올, 칼로리, 퓨린까지 다 없앤 무알코올 맥주 하이트 올프리. 후자를 택했다. 처음엔 설탕을 뺀 맥콜에 탄산을 주입한 미묘한 맛이 기괴하다고 느껴졌지만 한 모금 두 모금 삼키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한 캔을 비웠다. 그 후로 나는 이 방법을 인간관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편의점에서 만원에 네 캔을 고르는 친구의 장바구니에 카스 0.0을 한 캔 스윽 끼워 넣으면 적어도 한 시간은 아주 즐겁게 수다를 떨 수 있었다. 비알코올 맥주에 함유된 에탄올 0.001%는 콜라에도 함유된 자연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콜라를 마실 때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웃음이 잦았다. 그리고 더는 타오르는 가마와 함께 갈지자로 귀가하지 않아도 되었다.
논알코올 맥주의 인기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에 따르면 전 세계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 시장은 2024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23.1%를 기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맥주 시장 예상 성장률과 비교해 7배나 높은 수치다. 술을 멀리하면서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허나 한 가지 만족스러운 건 이제야 온전히 나한테 맞는 음주 방식을 찾았다는 것이다. 논알코올 맥주의 등장은 술 권하는 사회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던 나 같은 네 명이 드디어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자본주의적 증거랄까. 때로 그들은 열 명 중에 네 명이 되기도 하고, 세 명이 되기도, 한 명이 되기도 한다. 수술 후 논알코올 맥주, 하이트 제로 임산부, 암환자 무알코올 맥주, 백신 맞고 무알코올 맥주…. 모두 논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딸려 나오는 연관 키워드이다.
20대부터 통풍을 앓고 있는 지인은 요즘 칭따오 논알콜릭에 두부 텐더를 구워 먹으며 ‘치맥’의 설움을 달랜다고 한다.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또 다른 지인은 운동을 시작하고 아예 무알코올 맥주 예찬론자가 되었다. 원래 운동 후 맥주는 독약이라고 할 정도로 해로운데 무알코올 맥주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은 오히려 근육 회복과 신체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였다. 삶의 방식이 다른 만큼 먹거리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무알코올 맥주, 제로 샴페인, 비건 피자, 두유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 모두 비주류를 위한 고마운 대안이다. <술 권하는 사회>의 남편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똑똑한 요즘 사람들은 안다. 논알코올 맥주를 홀짝이며 잔을 부딪힌다고 그날의 ‘위하여’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다.
Credit
- 에디터/ 손안나
- 사진/ 이현석
- 어시스턴트/ 백세리
- 디자인/ GRAFIKSANG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