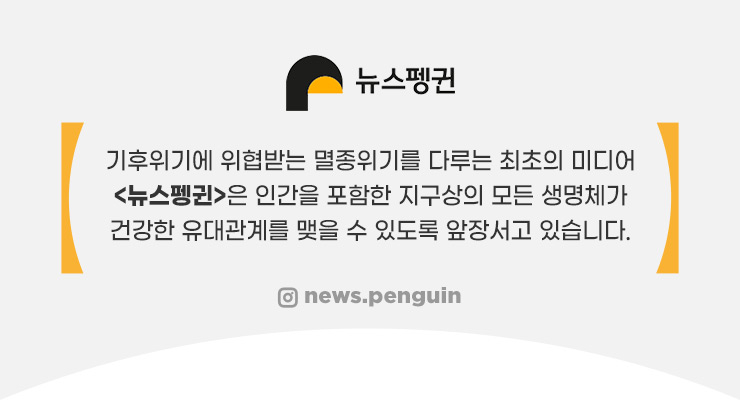LIFESTYLE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우리가 버린 옷'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
78억 명이 사는 지구, 이 지구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에 이른다. 그리고 그중 약 33%인 330억 벌이 같은 해에 버려진다. 실제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옷의 양은 30kg 정도다. 내가 무심코 버린 옷 한 벌이 대량으로 쌓여 소각되거나 수출되고 있다.
」1일 KBS '환경스페셜'에서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주제로 헌 옷 폐기 실태를 파헤쳤다.

KBS '환경스페셜' 방송 영상 캡처 /뉴스펭귄

KBS '환경스페셜' 방송 영상 캡처 /뉴스펭귄
환경운동단체 더 올 파운데이션(The OR Foundation) 엘리자베스 리켓 대표는 "(수입돼) 중고시장에 들어온 헌 옷의 40%는 쓰레기가 된다. 지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이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많은 쓰레기들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KBS '환경스페셜' 방송 영상 캡처 /뉴스펭귄

KBS '환경스페셜' 방송 영상 캡처 /뉴스펭귄
Credit
- 기사 제공 / 뉴스펭귄 (김도담 기자)
2025 겨울 패션 트렌드
#겨울, #윈터, #코트, #자켓, #목도리, #퍼, #스타일링, #홀리데이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