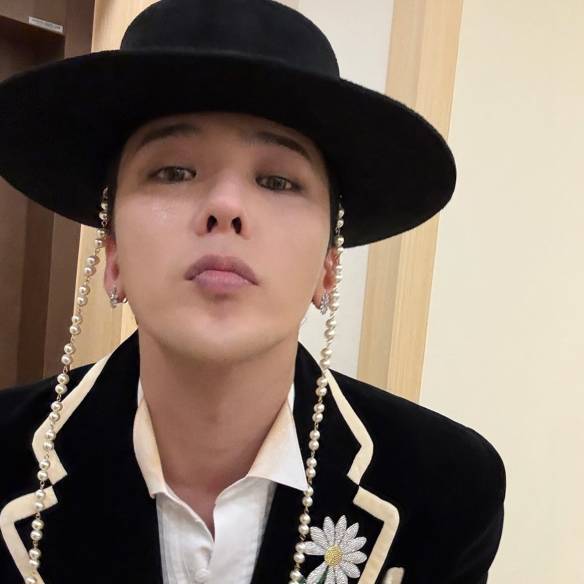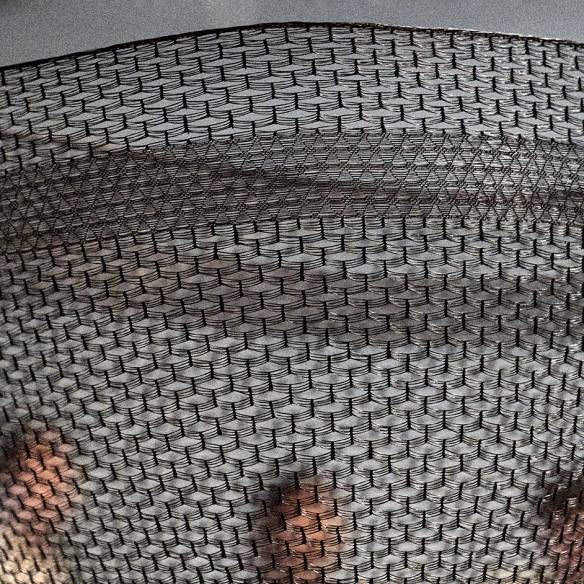경주에서 발견한 가장 동시대의 예술
과거와 미래가 맞물린 도시. 경주의 솔거미술관과 우양미술관에서.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경주
솔거미술관 & 우양미술관
“영원속에찰나가있는것이아니고 찰나속에영원이있다.” 소산 박대성의 수묵화에서 발견한 문장이 참으로 이 도시를 닮아 있었다.

솔거미술관 전경.

우양미술관 전경.
1천 년 전 신라인은 돌을 쌓아 하늘을 읽고 계절을 계산했다.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상상력이 맞닿은 이 구조물은 오늘날 여전히 경주의 상징처럼 존재한다. 몇 년 전, 경주의 밤 풍경을 담고자 사진가와 자정 넘도록 대릉원 일대를 돌아다녔다. 첨성대가 무려 핑크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자연과 인공의 인위적인 조합을 경멸한다. 흔히들 ‘K스럽다’고 표현하던가. 이를테면 청계천의 노래방 불빛 같은 것들. 그런데 핑크빛 첨성대라니 나는 그 기이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유레카를 외쳤다. 그게 왜 좋았을까. 서울 촌놈에게 일상성이 소거된 오래된 미래 같은 도시였기 때문일까. 과거와 미래가 나선처럼 맞물리는 이곳 경주가.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APEC 2025’의 슬로건이 눈에 띈다. 정상회담의 주무대가 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국제미디어센터가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우양미술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술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두 개의 전시를 나란히 열었다. 먼저 아시아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아모아코 보아포의 개인전 «I Have Been Here Before»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보아포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핑거페인팅 기법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찍고 눌러서 흑인의 삶과 정체성을 재해석한다. 피부의 질감, 시선의 방향, 궁극적으로 내면의 상태를 모두 손끝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페어장에서 마주했을 때와는 다른 속도로 느긋하게 그의 검정색을 들여다보았다. 새로운 발견이었다.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을 비롯해 모든 색상이 거기 녹아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가나 출신 건축가 글렌 드로쉬와 함께 설계한 파빌리온이었다. 한옥의 마당을 연상시키는 공간엔 서아프리카 아딘크라 문화를 상징하는 문양이 둘러져 있다. 나무 벽면에 걸린 초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자수 의상을 입고 있다. 한국과 가나, 두 문화 모두에서 자수는 전통적이며 상징적인 예술 형식이다. 나는 왜 그가 ‘나는 여기 와본 적 있어’라고 전시 제목을 지었는지 알 것 같았다. 핑크빛으로 물든 첨성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곳이 경주였기 때문이다. «Humanity in the Circuits»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의 백남준에 집중한 특별전이다. 이 시기는 그에게 예술적 전환기였다. TV, 위성, 로봇, 인터넷, 사운드, 퍼포먼스를 마치 회로처럼 엮어낸 그는 동양과 서양, 정신과 물질, 예술과 기술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절을 바쳤다. 경주에서 발굴된 고대 기마 인물형 토기를 모티프로 옛것과 새로움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제시한 <고대기마인상>을 비롯해 괴테의 고전에 영감을 받아 작업한 비디오 설치 연작 ‘나의 파우스트’ 중 <나의 파우스트 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 - 영원성>이 이 시기에 선보인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경제학’이 자본과 인간 가치의 충돌을 형상화한다면, ‘영원성’은 기술의 유한성 속에서도 기억과 정신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2025년에 꼭 맞는 화두 아닌가. 만약 백남준이 살아 있었다면 APEC을 앞두고 새로운 위성 중계 프로그램을 기획했을까? 이를테면 <바이바이 키플링> 같은 것? 나는 키스 해링의 퍼포먼스와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를 대적할 만한 동시대 아티스트를 머릿속으로 자못 진지하게 추리며 경주 엑스포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내에 위치한 솔거미술관에는 한국 수묵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의 «신라한향: Scent of Korea in Silla»가 열리고 있었다. 작가는 5살이 채 되기 전 부모를 여의고 왼팔을 잃었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수묵화를 독학했다. 본인만의 독창적인 수련법으로 그림을 익힌 작가답게 그의 수묵화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사가 아닌 대담하고 분방하게 재구성한다. 가장 천착한 대상은 불국사다. 오죽했으면, 1500년 전 김대성이 불국사를 지었다면 1500년 후 박대성은 불국사를 그렸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1994년, 청도 출신인 그가 고향도 아닌 경주로 이주한 데에는 사실 분명한 배경이 있었다. 현대미술의 요체가 궁금해서 뉴욕 소호에 방을 얻어 1년 동안 기거했던 작가는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한다. 경주로 가야겠다고. “나에게 최첨단의 현대는 다름 아닌 불국사구나”.(<신동아>, 2008) 작가는 그때부터 경주에 정착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5년엔 본인 작품 830여 점을 기증해 경주 최초 공립 미술관인 솔거미술관을 설립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벽화 <코리아 판타지>는 가로 12m, 세로 5m에 달하는 크기에 한반도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를 담은 대작이다. 백두산 천지연, 한라산 백록담, 금강산 봉우리에 음양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삼족오와 수렵도, 그 밑에는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부터 하회탈, 고려청자, 훈민정음 등이 인장처럼 그려져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오늘날 K-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근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작품을 설명했다. 그 뿌리에 한국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수한 문화 유산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다. 박대성은 작품 속 화제에 한자를 쓰지 않는다. 전시장 끄트머리에서 발견한 어느 소담한 수묵화 끄트머리에 그가 고안한 한글체로 어떤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영원속에찰나가있는것이아니고찰나속에영원이있다.” 이 문장은 참으로 경주를 닮았다. 초월적 도시 경주에서 만난 모든 예술 속에 과거와 미래가 포개어져 있었다. 최첨단의 현대였다.
※ «Amoako Boafo: I Have Been Here Before»와 «Nam June Paik: Humanity in the Circuits»는 11월 30일까지, «신라한향: Scent of Korea in Silla»는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솔거미술관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천군동)
우양미술관 경북 경주시 보문로 484-7(신평동)
손안나는 <바자 아트>의 편집장이다. 경주 시내 곳곳에서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를 숨은 그림 찾듯 발견하는 일이 즐거웠다.

«Amoako Boafo: I Have Been Here Before» 전시장 전경.

우양미술관 전경.

박대성, <코리아 판타지>, 2023, 종이에 먹, 500x1500cm.
현대미술의 요체가 궁금해서 뉴욕 소호에 방을 얻어 1년 동안 기거했던 작가는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한다. 경주로 가야겠다고. “나에게 최첨단의 현대는 다름 아닌 불국사구나”. 박대성은 그때부터 경주에 정착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Credit
- 글/ 손안나
- 디자인/ 진문주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2025 가을 패션 트렌드
가장 빠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셀럽들의 가을 패션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