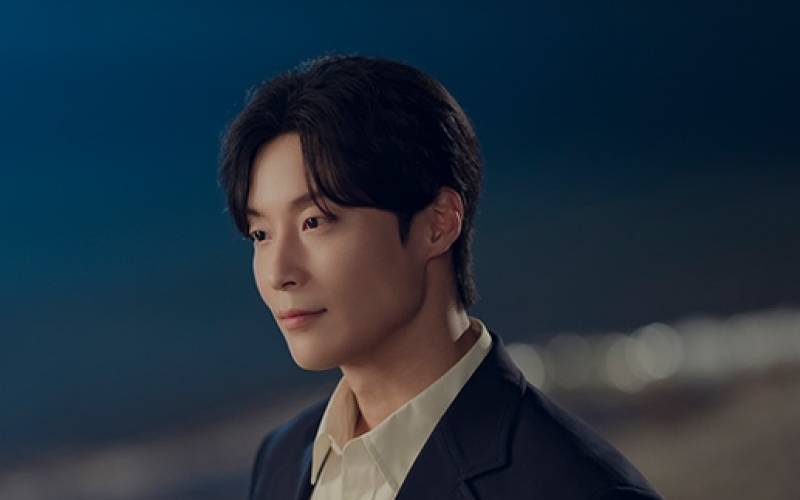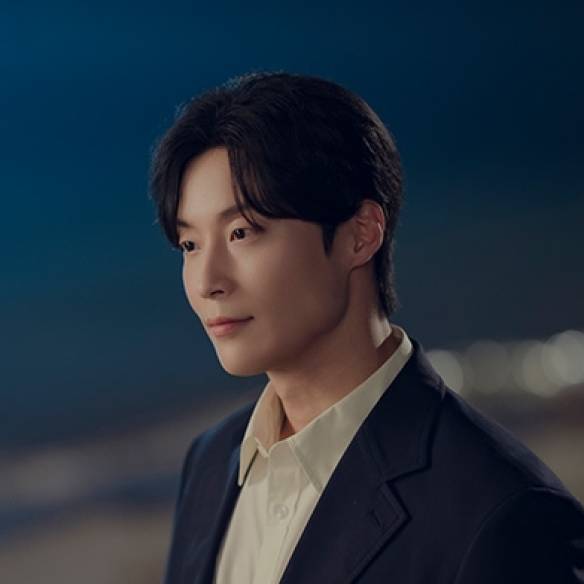바스크, 진짜 진짜의 삶
여름 한가운데, 프랑스의 두 도시에서 보내온 생의 활력으로 빛나는 편지.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바스크, 진짜 진짜의 삶
프랑스인에게 바다는 대서양 아니면 지중해다. 프랑스 지도를 펴보자. 프랑스 인 아무도 바다로 쳐주지 않는 영국해협 외에 프랑스에 맞닿은 바다는 대서양과 지중해다. 대서양이냐 지중해냐. 해마다 여름이면 프랑스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선택지다. 지중해는 잔잔하고 수심이 얕지만 백사장이 드물다. ‘아름다운 남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니스, 칸, 생트로페가 바로 지중해에 면한 마을들이다. 하지만 전 세계 젯셋족이 모여들면서 소박한 어촌의 정취가 사라지고 대형 관광 호텔들이 점령한 남프랑스를 비싸기만 하고 매력 없다고 절하하는 이들도 많다.
반면 대서양은 파도가 세고 수심이 깊다. 어딘가 오밀조밀한 느낌이 드는 지중해에 비하면 대서양 쪽은 짠 내가 풍기는 그야말로 드넓은 바다다. 대서양에 손을 들어주는 프랑스인들은 대부분 보르도부터 길게 뻗은 황금 백사장으로 유명한 랑드 지역을 최고로 친다. 그리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백사장 끝에 비아리츠가 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에게 비아리츠는 프랑스의 끝이다. 나 역시 프랑스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사실 비아리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툴루즈에서 태어나 피레네 산맥의 정기를 받아서인지 바스크 사람도 아니면서 유달리 바스크 지역에 애착을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의 비극이 바스크 독립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렴풋한 지식 외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바스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 바스크는 대서양과 피레네 산맥 사이에 낀 프랑스의 왼쪽 끝과 스페인의 왼쪽 윗부분에 걸쳐진 지역이다. 지도상으로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이라는 양쪽 문 사이에 낀 작은 경첩 같아 보인다. 공식적으로 바스크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바스크는 스페인도 프랑스도 아니다. 바스크는 바스크다. 정말이다. 당장 기차가 비아리츠만 넘어가도 새로운 언어들이 쏟아진다. 거기에는 에네코, 이나키, 안티온, 파트시, 마이아나 같은 차라리 그리스어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 그들은 스위스 샬레를 닮은 빨간 지붕에 빨간색으로 창문과 문을 칠한 새하얗고 높다란 집에 사는데 마을 이름이 또 걸작이다. 엔다예, 잇타수, 게타리, 오세, 에스플렛불어와 스페인어 표지판 아래 당당하게 적혀 있는 바스크어, 유스칼 에리아는 처음 접한 이를 당황시킨다. 게타리라니, 무슨 이런 이름이 있는지.
다른 점은 또 있다. 축구에 열광하는 프랑스나 스페인과는 달리 바스크의 공식 스포츠는 갈고리 같은 큰 장갑을 끼고 공을 벽에 던지는, 스쿼시를 닮은 펠로트 바스크이며 비공식 스포츠는 서핑이다. 바스크 지역에 면한 대서양을 가스코뉴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집채만 한 파도로 유명한지라 예로부터 유럽 서퍼들의 서식지였다. 하지만 바스크인에게 서핑이란 핫하고 쿨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생활 운동이다. 왜냐하면 파도가 거기 있으니까. 뒤뚱뒤뚱 걷는 세 살배기부터 배불뚝이 할아버지도 서핑을 한다. 굳이 특징을 찾자면 한결같이 바스크 지방에서 생산하고 디자인하는 서핑 브랜드 파흘레멘티아를 애호한다는 정도?



게다가 바스크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르다. 사실 바스크는 먹거리 천국이다. 생각해보라. 앞에는 대서양이, 뒤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다. 그래서인지 바스크인들은 오로지 ‘진짜’만 먹는다. 프랑스에서 햄 하면 바욘인데 바욘은 바스크다. 진짜 바욘 햄은 오로지 바스크에만 있는 바스크 돼지, 킨토아로 만든다. 바스크 사람들에 따르면 타지에서 먹는 바욘 햄은 이름만 바욘을 딴 가짜 바욘 햄이기 십상이란다. 왜냐하면 킨토아는 바스크에만 있고, 킨토아를 킨토아답게 키우는 방식도 바스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해마다 봄이면 보송보송한 킨토아 새끼들을 산으로 몰고 간다. 거기서 킨토아는 동서남북으로 산을 누비며 자유롭게 도토리와 풀 등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킨토아는 몸집이 작고 단단하다. 바스크에서 킨토아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는 양 역시 마찬가지다. 복닥거리며 작은 아파트에 사는 도시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스크 양들은 넓은 들판에서 유유자적 풀을 뜯는다. 인간에게 잡아먹힐지언정 최소한 살아 있을 때만큼은 행복하다.
과장 좀 보태서 살구만 한 블랙 체리로 유명한 잇사수 마을 뒷산 어디에 자리 잡은 아라네코 보르다(Haraneko Borda)는 진짜에 목매는 바스크인들이 좋아하는 식당이다. 요즘 프랑스에서 미쉐린 가이드보다 더 공신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푸딩에서 프랑스 제일의 농장 식당으로 선정한 아라네코 보르다는 사실 식당이라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다. 문을 여는 날보다 안 여는 날이 더 많다. 게다가 저녁에는 12명 이상 단체만 받는데 그나마도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직접 키우는 양이나 킨토아를 잡아서 오로지 나무로만 불을 때는 화덕형 오븐에 넣고 이틀을 구워야 하기 때문이다. 농장형 식당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 집의 모든 것은 산 아래 펼쳐진 밭에서 나온다. 직접 키운 옥수수로 만든 전병 탈로아, 직접 키운 킨토아를 훈제해서 얇게 저민 베이컨 마이트라일라, 역시 직접 키운 토마토와 양고기를 안주인이 직접 서빙한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진짜 식탁이다.
진짜 먹거리에 대한 집착은 바닷가에서도 다르지 않다. 노르망디에서 태어났으나 진짜 낚시를 찾아 생장 드 루즈에 라 보에트(La Boete)라는 식당을 연 아르노와 발렝탕은 오로지 그날 그날 항구에 들어오는 신선한 해산물로만 상을 차린다. 작은 오징어를 토마토 소스로 조리한 시피롱, 게 안에 게살과 야채로 속을 채운 트상구로, 토마토와 고추, 생선을 넣고 조린 코스케라 같은 전통 바스크식부터 참치 다다키까지 메뉴는 매일 바뀐다.
바스크인에게 진짜는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흙의 냄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가족, 바다의 색깔,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 같은 모든 실체다.
바스크인들의 진짜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라는 어마무시한 개념에 굴하지 않고, 나고 자란 땅의 문화를 지켜왔다. 그들에게 진짜는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흙의 냄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가족, 바다의 색깔,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 같은 모든 실체다. 해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5일간 열리는 바스크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생장 드 루즈 축제만 해도 그렇다. 생장 드 루즈는 엄연히 프랑스 땅에 있지만 축제는 오로지 바스크만의 색깔로 치러진다. 애어른 할 것이 없이 모두 검정 옷에 빨간 스카프, 바스크 베레를 쓰고 거리로 나온다. 바스크 음악, 바스크 춤이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온 동네 구석구석이 거대한 춤판으로 변신한다. 바스크에서 춤과 노래, 음악은 공짜다. 일곱 살짜리부터 7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한 동네 악단이 바스크 음악을 연주하며 바닷가를 돌면 춤이 절로 나온다. 버려진 르노자동차 공장은 축제날이면 공식 클럽이 된다. 확 트인 천장, 외부로 열린 문, 쉴 새 없이 서핑 동영상이 흘러나오는 대형 프로젝터까지 겉모습은 파리의 그 어느 클럽보다 핫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파리의 잘나가는 클럽에서처럼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춤과 음악과 술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 동네에서 자란 남편의 친구는 축제날이면 70명가량의 가족과 친구를 초대해 점심식사를 대접한다. 인원이 너무 많아 구청의 허가를 받아 길에다 차리는데, 말이 초대지 사실 꼬마 관광열차 운전사부터 사진 찍는 관광객까지 모두에게 한잔씩 권하는 동네 테이블이나 다름없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런 친절과 여유가 놀라웠다. 나는 얄밉도록 네 것 내 것을 챙기는 삶만 살았으니까. 정작 악착같이 챙긴 내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바스크인들이 속없이 유달리 친절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삶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임을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태어난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소중히 하는 삶, 나와 내 이웃이 가꾼 땅의 산물을 먹는 삶, 그리고도 남는 시간에는 바다를 누비며 자연을 아낌없이 누리는 삶. 살아가는 동안 만난 인연과 흔연히 술 한잔을 나누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만 추구하는 삶. 진짜 인생 그리고 진짜 진짜의 삶.
Credit
- 에디터|Harper's BAZAAR
Celeb's BIG News
#에스파, #올데이 프로젝트, #김다미, #호시, #몬스타엑스,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