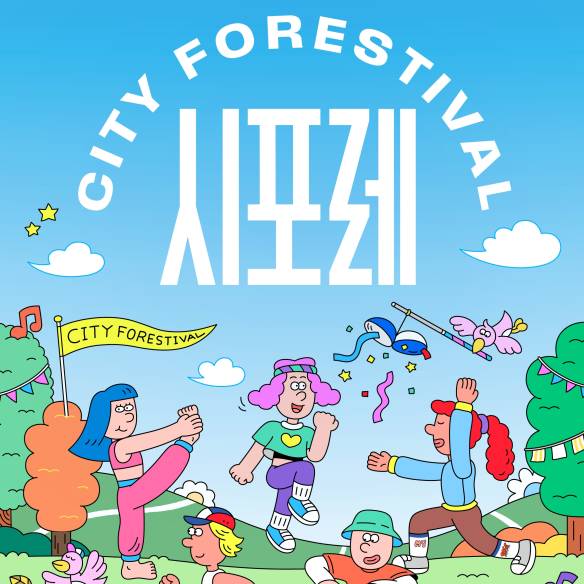한강의 신작 '빛과 실'을 읽고 쓴 리뷰
문학평론가 선우은실 작가가 한강의 에세이를 읽고 쓴 리뷰.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고통을 연결하는 세계에 대하여
한강의 새 에세이 <빛과 실>은 고통과 연결의 가능성에 관해 묻는다. 생활비평 산문집 <웃기지 않아서 웃지 않음> 저자 선우은실의 이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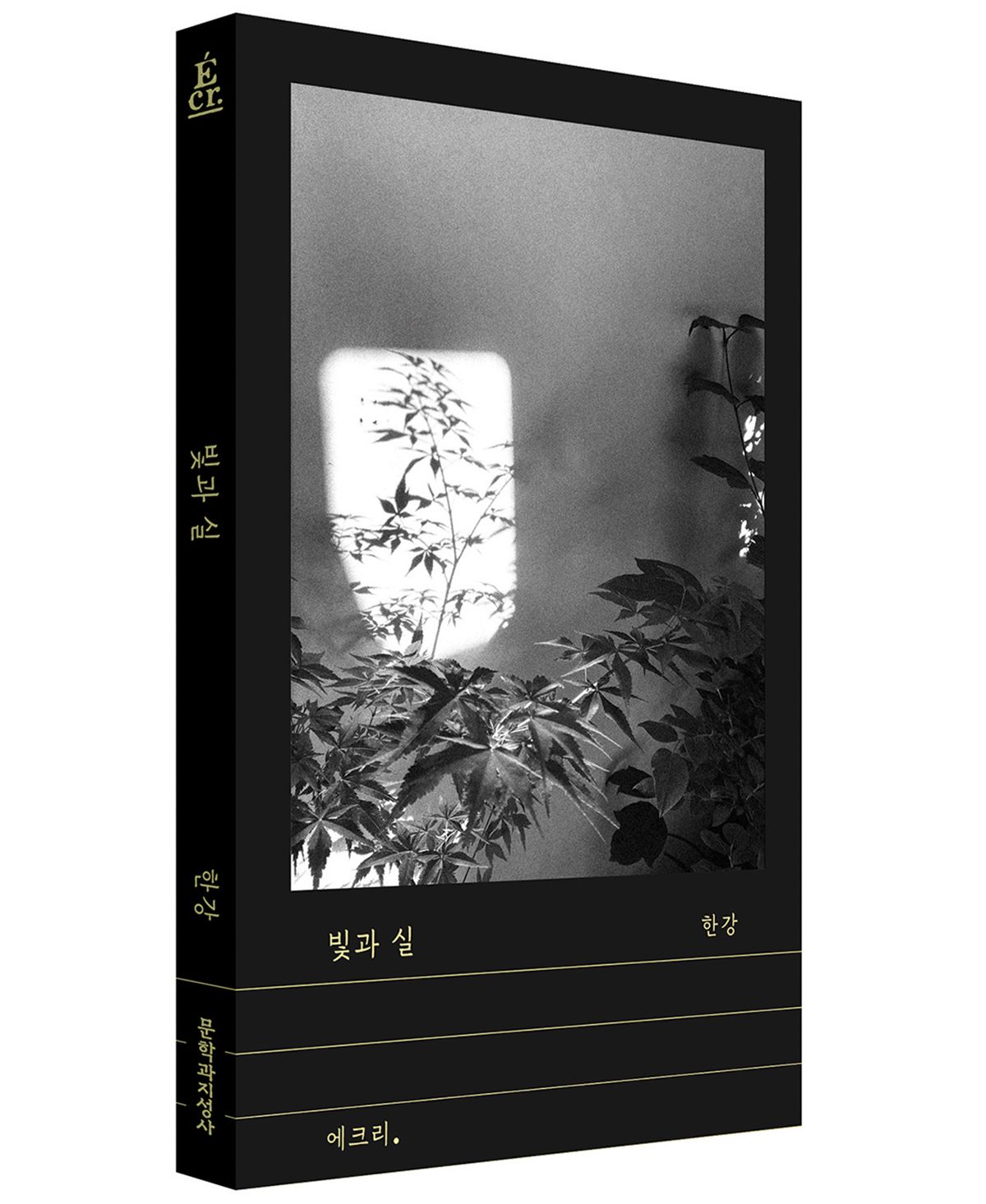
최근 ‘공감하지 못함’에 대해 고민했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을 하진 않지만, 기쁨이나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나는 그것에 온전하게 내 감정을 이입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지인의 경사가 내게도 경사일 수 있는가? 친구의 슬픔이 오롯이 나의 슬픔일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느낀다. 지인의 경사가 내게 경사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지인이 그 사실에 기뻐하기 때문에, 즉 그가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타인의 슬픔이 내게 슬픔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가 슬퍼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그가 슬퍼하는 바로 그 원인을 곧 나의 슬픔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냐면 그렇지는 않다. 다만 사람들이 정말로 타인의 일에 공감하고 그의 삶에 연결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을 따름이다. 그들은 정말 그것을 ‘나의 일’과 다름없게 느끼는가? 그것이 연결인가?
사실, 연결을 말할 때 나는 오히려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절감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오롯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한계,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단절과 고립감이 ‘연결’을 이해하는 핵심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의 미덕으로 추구하는 ‘연결’이란 안정에 대한 감각이기보다는 불안, 고독, 고통스러움에 가깝다.
에세이에서 한강은 ‘고통의 연결’에 대해 말한다. 그녀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소설로 쓰면서 고통에 하릴없이 빨려들었을 때, 독자가 그의 소설을 읽으며 고통을 고백했을 때, 이들이 느낀 것은 당시 광주의 피해자가 겪은 것과 정확히 같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경험한 고통은 무차별한 폭력을 자행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전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자면 연결이란 ‘고통’에서 만나는 일이다.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의 근원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그가 느끼는 방식과 같은 형태로 상상하거나 매만질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그럴 수 없다는 다소 분명한 대답을 도출한다. 그리고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고통스럽게 만든다. 나는 타인의 감정의 근원에 조금도 틀림없이 도달하는 것을 이해라 여기지 않고, 그래야만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그들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한 애씀의 순간이 있어야만 최소한 연결이 시도된다. 우리는 애씀의 고통에서 만난다.
Credit
- 글/ 선우은실(문학평론가)
- 사진/ 라니서울, 문학과지성사
- 디자인/ 이진미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