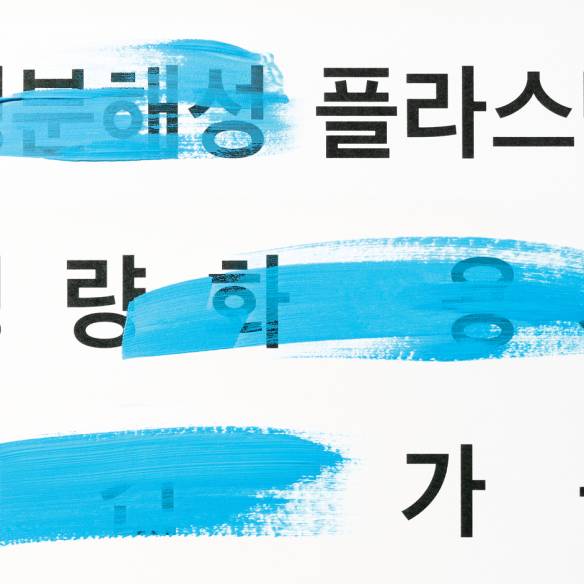SUSTAINABILITY
한달 동안 일회용 생수병 끊기에 도전했다
한 달 동안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80
2050
5900
178
300000000

간이 정수기라는 모순
얼마 전 이사를 했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가장 구석 동이다. 살아보니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이 하나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가 매우 귀찮다는 거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소규모 집들이를 몇 차례 벌이고 나니 이틀에 한 번꼴로 쓰레기가 나왔다.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생수병. 손님이 물을 찾으면 나는 예쁜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주는 대신 1L짜리 생수병을 하나씩 손에 쥐여주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날의 쓰레기 더미를 이고지고 분리수거함까지 걸어가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생수를 배달시켜 먹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된 일이건만 그 무게를 제대로 실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일단 간이 정수기를 써보기로 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 브랜드 브리타로 정했다. 브리타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자신이 소비하는 플라스틱 생수를 줄이면 얼마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 숫자로 알려주는 메뉴가 있다. 하루 평균 1L 페트병 한 통을 배출하는 내가 생수병을 끊을 경우 연간 6.6kg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67.3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단다.
그뤠잇. 이 대목에 강하게 설득당했다. 활성탄 필터를 주전자 용기에 부착한 간단한 설계도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유려한 디자인에… 흠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산다는 형용모순이 불편했지만 이번엔 기필코 마르고 닳도록 써야지 다짐하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쓴다는 3.5L 모델 대신 음료칸에서 손쉽게 꺼낼 수 있는 2.4L 모델로 구입했는데 혼자 사는 나에겐 사흘에 한 번 수돗물을 채워주면 딱 맞았다. 물맛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거실이며 부엌이며 침실이며 집 안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던 반쯤 마시다 만 생수병도 자취를 감췄다. 무엇보다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다. 분리수거는 열흘에 한 번이면 충분했다.
만족스러운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정수기 상단 뚜껑에 달린 전자 화면에 필터 교체 표시가 떴다. 필터를 교환하려고 주전자를 분해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브리타의 정수 필터야말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안에 있는 활성탄 성분을 버리고 외부에 있는 플라스틱만 분리배출을 하려고 해도 필터 자체가 분해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다급히 인터넷을 뒤졌다. 필터 수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는 독일 본사와 미국, 호주 등이며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엔 오롯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지난해부터 십년후연구소,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등을 중심으로 ‘폐필터 수거 프로그램 시행’과 ‘지속가능한 필터 개발’을 요구하는 ‘브리타 어택’ 운동이 진행된 바 있다. 브리타는 “올해 안으로 폐필터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브리타 정수기 사용 잠정 중단하겠다 선언하기도 했다.
“친환경 소비는 친환경이 아니다.” 엊그제 KBS <환경스페셜>에서 접한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귀차니스트를 위한 지구는 없는 걸까. 생수병을 끊고 브리타를 끊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잠시 망연해졌다.
에디터/ 손안나

매일 아침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지구에 무해한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 않은 날. 아무런 소비도 하지 않은 무지출 데이를 달성한 날에는 월든 호숫가에서 하루를 보낸 듯 자연의 일부가 된 기분마저 든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인 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쓰레기는 차곡차곡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그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플라스틱. 일회용 생수병이 원흉이다. 숨만 쉬어도 쓰레기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한탄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에만 플라스틱 생수통을 여러 개 버렸다. 거기에 매일 아침 배달시켜 먹는 야쿠르트 용기, 커피 필터, 밀키트 포장재까지. 아예 자연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 한 달 동안 플라스틱 생수부터 끊어보기로 했다.
일단 버튼만 누르면 1초 만에 주문이 완료되는 물풍선 앱부터 지웠다. 주로 구매하는 브랜드, 용량, 개수를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부턴 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앱이다. 조금 더, 조금만 더 편한 걸 찾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걸까. 편리함에 익숙해져 놓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하며 오랜만에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일회용 생수를 끊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재미는 보리차가 식으면 물병에 가득 채워 냉장고에 넣어두고 물을 다 마셔갈 때쯤 다시 보리차를 끓이는 것이다. 외출할 때도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러 500ml짜리 생수를 사곤 했는데 미리 텀블러에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습관도 생겼다.
사놓고 쓰지 않던 와인 전용 에코백에 넣어 다니니 환경을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생겨 일상이 더 즐거워졌다.
조금 난감했던 건 커피를 내릴 때였다. ‘물이 다 같은 물이지’ 하면서 오랫동안 수돗물을 끓여 핸드드립을 해왔는데 물이 커피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생수를 끓인 물로 커피를 내려왔기 때문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에 빠른 속도로 생수병이 쌓이는 또 다른 원인이었다. 예전에 마크로바이오틱을 연구하는 분을 인터뷰하러 갔을 때 자연여과 방식으로 하루 동안 거른 수돗물로 차를 끓여 내어주셨던 게 떠올랐다. 플라스틱 생수병을 몇 개씩 버리는 대신 시도해보기로 했다.
3주차에 딱 한 번 플라스틱 생수에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여행 기사를 쓰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녀야 했던 날이었다. 코로나 시국이라 공공장소에 자리한 정수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고 무더위에 탈진할 것 같아 나와의 약속을 깨고야 말았다. 아침에 1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부엌 찬장 한 구석에 방치된 보냉병에 보리차를 넣어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테지만.
매일 아침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시작하는 새로운 루틴이 생긴 이후 깨달은 사실은 그동안 내가 지독한 플라스틱 생수 중독자였다는 것이다. 하루에 5분씩만 마실 물을 준비하는 정성을 들이면 그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지지 않아도 되었다. 어쩌면 그동안 에코라벨 생수를 고르며 ‘오늘도 지구를 위한 실천을 했다’는 자기 만족에 속아온 건 아니었을까.
글/ 김희성
Credit
- 에디터/ 손안나
- 사진/ Getty Images
- 웹디자이너/ 한다민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