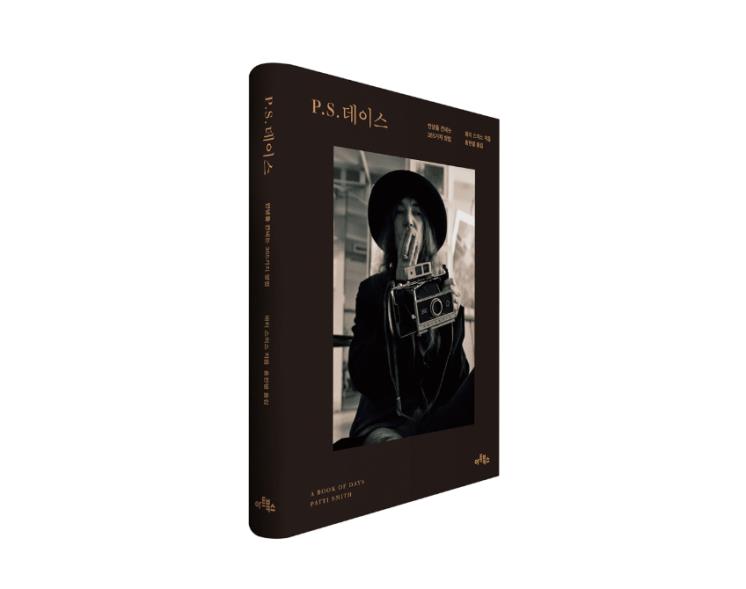LIFESTYLE
이소호 시인이 이별 후에 쓴 시
형상과 그림자 그리고 허상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책을 펼친다
한쪽 눈을 감고
연필에 가만히 네 얼굴을 댄다
너 그릴 줄은 알고 이러는 거니?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다
나는 종이의 거친 면에
흑심이 다 닳을 때까지
그었다
너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이 종이가 밤이 될 때까지
* 안경진 작가의 <형상과 그림자 그리고 허상> 제목 차용.
글/ 이소호
당신이 쓴 사랑시를 해설해달라.
조각가 안경진의 작품 <형상과 그림자 그리고 허상>에서 제목을 따왔다. 짧고 단순하지만 사랑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아무와도 연애하고 있지 않을 때 썼기 때문에 사랑을 되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이러는 거야?”라는 질문에도 흰 종이가 까맣게 될 때까지 칠하는. 그런 과정이 사랑이다.
당신의 사랑은 어떤 맛이었나?
떫었고 붉었고 물처럼 항상 어느 그릇의 모양이었다.
당신의 사랑은 만나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때 그때 형체가 달라졌나 보다.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배워가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예를 들어 나는 IT에 문외한인데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지식이 쌓이면서 시에도 IT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과정이 재미있다. 사랑이 취미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언제나 ‘을’이었다.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쪽이었고 늘 아쉬운 쪽이었으니까. 한동안은 비혼주의자로 살았다. 예쁜 원피스를 전부 내다 버리고 생애 첫 짝사랑을 시작했다. 그 시기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를 썼다. 그리고 짝사랑에 실패했다. 이제야 예쁜 옷을 다시 입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또 헤어졌다.
당신은 당신의 시처럼 연애하나? <캣콜링>의 화자처럼 직설적이고 도발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는 쪽인데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회피형 인간이었다.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 그 후에 네 맘이 변한 것 같아”라고 했더니 “들켜서 민망하네.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다. 대화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한 대로 그동안의 연애담을 모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출판했다. 사랑을 잃고 당신은 썼다. 무엇이 남았나?
허무와 공허가 남았다. 나에게 이 책은 일종의 반성문이다. 다시는 이렇게 연애하지 말아야지. 실수를 반추하는 마음으로 짝사랑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로 써 내려간 성장기다. 주제가 사랑이라서 더 괴롭거나 힘든 건 아니었다. 이 또한 인생이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옛 연인들은 출간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데 일 년 정도 걸렸다. 대부분 직접 연락해서 허락을 받았다. 그 사람을 찾는 일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아예 뺀 글도 있다. 처음에는 쿨하게 허락하는데 내가 보내준 글을 읽은 뒤엔 “내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었잖아”가 되더라. 이 글은 오롯이 나의 시선, 한쪽의 이야기이다. 당연히 허구가 들어 있고 진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성적인 얘기도 나와. 괜찮지? 전에 네가 써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생각보다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내 시선으로 쓴 거니까. 너도 예술을 하니까 동의하지?” 책에도 쓰여 있지만 연애 시절 그가 나를 찍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순간부터 나는 이미 전시되었다. 그래서 말한 것이다. 네가 하는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하는 것뿐이라고.
사랑이란 결국 당신의 시 ‘나를 함께 쓴 남자들’*처럼 끝내 한 문장만 남는 과정이 아닐까.
일명 ‘동태눈깔’이라고 하지 않나. 성의 없는 문자. 성의 없는 등. 성의 없는 옆모습 같은 걸 보면 이별의 순간을 직감한다. 아, 빨리 헤어지자고 말해야겠구나. 그 모든 변화를 너무 빨리 감지하는 게 비극이라면 비극이겠다.
요즘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도 안 해서 사회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나.
포기했거나, 질렸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끊임없이 사랑의 가능성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책에도 나오듯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정도로.
<닥터 후>라는 드라마의 닥터가 그렇듯 나는 나를 계승하면서 진보하고 싶다. 그 과정에 기쁨을 같이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을 것이다. 그게 희망이니까. 나의 가족이 될 사람을 찾는 일도 결국에는 희망을 찾는 일이다.
우리에게 왜 사랑이 필요할까? 혹은 우리에게 왜 시가 필요할까?
사랑이 없는 세계를 꿈꾸기 어렵듯이, 나에게는 시가 없는 세계는 종말처럼 느껴진다. 둘 다 없는 세계에서 나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 To. 경진
요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알아
2010년 3월 2일
경진이가
‐ 이소호, ‘나를 함께 쓴 남자들’(<캣콜링>, 민음사, 2018) 중에서
트레이시 에민의 <나와 함께 잤던 모든 사람들>에서 제목을 차용했다. 작가는 헤어진 애인과의 편지를 그대로 시에 인용한다. 편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섯 번 반복되며 누락된다. 마지막에는 편지의 첫 마디인 “요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알아”라는 한 줄만 남는다.
Credit
- 글/ 이소호
- 일러스트/ 백두리
- 어시스턴트/ 백세리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2025 겨울 패션 트렌드
#겨울, #윈터, #코트, #자켓, #목도리, #퍼, #스타일링, #홀리데이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