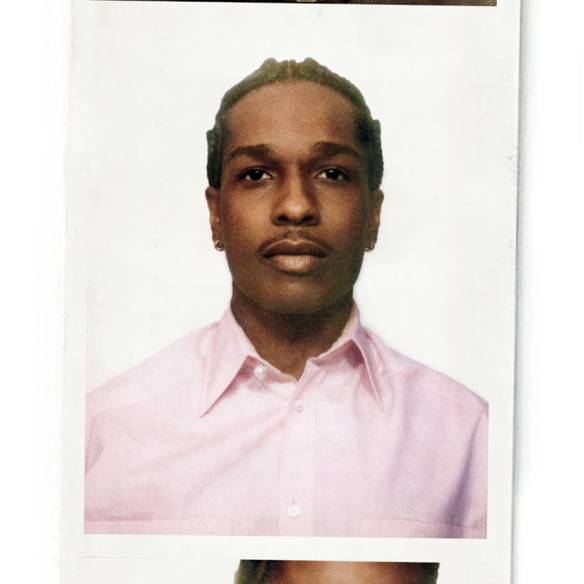FASHION
패션계 사람은 정말 무서운가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패션 인사이더들을 관찰한 경험이 있는 시인 이우성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해치지 않아요. 아마도?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영화 <크루엘라>는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에스텔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런던 패션계를 발칵 뒤집는 크루엘라로 ‘흑화’하는 이야기다. 클루엘라로 분한 엠마 스톤의 스타일링은 1970년대 파격적인 펑크 룩의 아이콘 데비 해리, 니나 하겐 등에서 영감받았다.
무섭긴, 개뿔.
음, 개뿔은 심한 말이다. 때는 바야흐로 2005년. 나는 남성 패션 매거진 인턴이었다. ‘인턴 에디터’였다고 적고 싶지만, 선배나 편집장이 ‘에디터’로 인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쓰기가 애매하다. 직업란에 적는 거면 당연히 ‘인턴 에디터’라고 하겠지. 아무튼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고 쓰고 나니 미안하지만, 이상했던 건 맞잖아요?) 자기들만 에디터고, 나 같은 걸 에디터로 불러주려면 귀머거리 3년… 뭐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고생을 꽤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매거진 사람들도 그랬고, 그 바닥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굳이? 그러게, 굳이. 쓸데없이 까다로우니 무섭다는 얘길 듣지.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고, 패션팀 선배 촬영장을 따라갔다. 가봐야 딱히 하는 일은 없지만, 선배들은 뭐라도 시켜먹으려고 인턴인, 만만한 후배를 촬영장에 데리고 간다. 아, 참고로 나는 피처팀 인턴이었다. 한 시간쯤 촬영했나…. 사진가가 화장실에 가고, 선배는 담배 피우러 간 사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쌍욕을. 사진가에 대해. 존재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잠시 후 사진가가 돌아오자 스타일리스트가 말했다. “오늘 사진 너무 좋아. 대박.” 웃으면서. 무서웠다. ‘또라이’니까, 걔. 또라이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때도 유명했고 지금은 더 유명하다. 물론 지금은 안 무섭다. 쪼잔하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고딩이 무섭지.
신경질적인 것과 무서운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음…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무섭다기보다 신경질적이다. 누가 더 신경질적인지 대결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다. 웃어도 날이 서 있다. 과거형이다.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패션 에디터, 패션 브랜드 홍보 담당자 정도가 내가 경험한 패션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진가도 있고, 모델도 있고 홍보 에이전시 직원도 포함될 것 같다. 하지만 앞의 네 직업군이 아주 신경질적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날카로운 공기가 전해지는 것 같다. 아, 이런 걸 무섭다고 하는 건가?
2015년 정도였던 거 같은데, 휴가를 내고 밀라노 컬렉션에 패션팀 에디터들을 따라갔다. 나도 동네에서 옷깨나 입는다고 자부했는데, 거기 갔더니 시골 촌놈이었다. 당연히 짜증이 났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 없는 게, 아, 나는 피처팀 에디터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즈음 쇼가 열리는 공간 근처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멋쟁이들과 비교하느라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다. 내 눈엔 그게 보였다. 심지어 그날 저녁에 모 패션 브랜드 차장이랑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꺼낸 주제는, 어느 브랜드의 홍보 담당자가 까칠한데, 다른 브랜드의 담당자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였다. 거기에 누군가 한마디 보탰다. “에이, 그 사람은 예민한 축에도 못 들죠.” 집에 가서 신라면 끓여 먹고 싶었다.
신경질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자기가 돋보이지 않아서 부리는 신경질,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든 게 돋보이지 않아서 부리는 신경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신경질을 부리고, 그 감정으로 어떤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느낀다. 아마도? 일부를 전체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신경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당연한 소리지만, 패션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든다. 자신을 꾸미건, 다른 사람을 꾸미도록 만들 건,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어야 하는 걸 만든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나타나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움을 꺼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마감 날짜가 있다. 계절, 제작 일정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내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감. 마감이 다가올수록 신경질은 증폭된다. 그것을 창조의 고통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다. 물론 옆에서 볼 때 그런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긴장될 뿐. 저 또라이가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짜증을 낼 수 있으니까. 웃고 있지만, 내가 방금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쌍욕을 했을 수도 있고! 3년 차 에디터였을 때로 기억하는데 대략 잡지 마감 즈음이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하에서 타고 오신 분이 계셨다. 다른 매거진 편집장님이었다. ‘님’이라고 굳이 적는 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무 짓도 안 했다. 인상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 내가 말을 걸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진짜 한 대 맞을 것 같았다. 그분은 나와 성별이 달랐고 내가 힘도 훨씬 세니까 싸우면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만… 졌을 수도 있다. 압도되었으니까. 하지만 거듭 그분은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사람들이 무섭다는 건, 예민한 공기를 잘 만든다는 것이다. 때리거나 고함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긴장시켜 ‘쫄게’ 만들고, 분위기를 뾰족하게 만든다(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정도? 딱히 원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 음, 그냥 자기애가 강해서?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니까. 해치지 않는다. 신경질적인 사람일수록 겁이 많다. 아마도?
아무튼 이조차 옛날 얘기다. 요즘은 어떠냐면, ‘안 신경질적인’ 패션계 사람들이 많다. 신경질적인 선배, 선생님, 차장님을 보며 성장한 세대는 알게 된 것이다. 굳이 저렇게 굴 필요가 없다는 걸. 왜냐하면 그건 별로 쿨하지 않거든. 나는 저런 선배가, 선생님이, 차장이 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한 친구 중 일부는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기존의 패션 피플 중 일부도, 신경질적이다, 예민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변해버렸다. 성격을 헤어스타일처럼 바꿔버리는, 이른바 빠른 태세 전환은 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적었듯, 개뿔은 심한 말이다. ‘또라이’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 심약한 겁쟁이라는 말이지.
Credit
- 에디터/ 손안나
- 사진/ 월드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 글/ 이우성(시인)
- 웹디자이너/ 한다민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