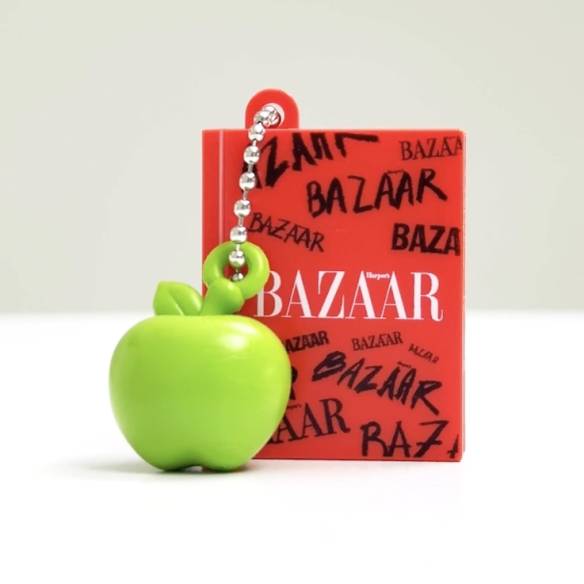SUSTAINABILITY
정관스님은 어떻게 셰프들의 셰프가 되었을까?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꿈꾸는 전 세계 미식 업계의 시선은 어쩌다 한국의 사찰음식에 꽂히게 된 걸까. ‘절에서 먹는 밥’ 그 너머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라남도 장성에서 나고 자란 감태와 톳. 겨우내 발효시켜 먹을 수 있는 식재료다.
하지만 셰프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미슐랭 3스타 타이틀을 지닌 프렌치 해산물 레스토랑 르 베르나뎅(Le Bernadin)의 총괄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는 그의 요리, 즉 한국의 사찰음식에서 틀을 벗어난 무언가를 봤다고 말한다. “스님께선 작물을 있는 그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공기, 물, 햇빛의 힘을 믿는 거죠. 그가 만들어낸 요리는 어느 정도 전통을 지키지만 규칙을 많이 깨뜨립니다. 꽤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더욱 특별한 요리사라고 할 수 있고요.” 고기 없이, 계절마다 자연이 내놓는 딱 그만큼의 작물만을 활용해 완성한 음식은 맛에 있어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는다. <뉴욕 타임스>의 푸드 저널리스트 제프 고르디니에(Jeff Gordinier)는 정관스님의 요리를 맛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세계 어느 유명 식당에 내놓아도 그 맛과 멋에 반할 만한 요리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너무 감동한 나머지 한국에 가야겠다고 말했죠. 정관스님과 사찰음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정관스님의 음식은 어떻게 세계 유수의 음식 전문가들에게 이토록 강한 인상을 남긴 걸까.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찬기운이 가시지 않은 2월의 어느 날, 그 답을 찾고자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백양사로 향했다. 스님은 일본에서 음식 교류 행사 준비를 마치고 막 귀국한 참이었다. 새파란 감태와 톳, 물에서 자란 미나리. 장성 땅에서 나고 자란 제철 식재료를 분주히 풀어놓는 스님 뒤로 직접 담근 양념장들이 줄지어 있다. “사찰음식의 핵심은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존중하겠다는 의식이에요. 식재료를 다듬어 그릇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그 마음가짐 하나로 설명됩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스님의 손을 따라가다 들은 말. 그제서야 주변을 살피고서는 불 위의 냄비가 하나라는 걸 깨달았다. 미나리와 톳, 두부를 순서대로 데치는 동안 그 냄비 안의 물이 한 번도 버려진 적 없다는 것도. 강연과 해외 출장,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사찰음식 체험 템플스테이까지. 정관스님이 빼곡한 일정을 비집고 <바자>와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낸 이유는 하나다. 사찰음식의 진짜 가치를 가능한 더 자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정관스님 사찰음식에 메뉴나 정해진 레시피 같은 건 없어요. 제철에 나는, 직접 농사 지은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수확해 만든다는 것만 말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그날 만든 음식은 그날 다 먹는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하퍼스 바자 그래서 탄소발자국으로 따지면 0km에 수렴할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도 하죠.
정관스님 음식을 만들 때도, 먹을 때도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곱씹다 보면 결국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생물이 건강히 순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니까요. 육식을 멀리하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죠. 자연에는 순리가 있어요. 인간은 고등한 생명체로서 뭇 생명을 살리고 존중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방향의 전부예요. 현 세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하퍼스 바자 일반 채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관스님 사찰음식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신채란 파, 달래, 부추, 마늘, 흥거(무릇) 다섯 가지 채소를 뜻하는데, 공통적으로 몸에 열을 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차분하고 정적인 수행을 위해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는 식재료는 쓰지 않는 것이죠. 대신 김치나 된장, 장아찌처럼 발효된 음식을 곁들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소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단순히 채소만 먹는 식단으로 설명할 순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고기를 금하진 않으니까요. 분명한 건 단순히 맛만 따지는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성과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에 가까워요. 사찰음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이유겠지요.

약식동원.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말이자, 정관스님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내 몸과 같이 정성스레 기르고 손질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몸을 이롭게 만든다.
정관스님 썩고 곰팡이 핀 것만 아니라면 절대 식재료를 버리지 않아요. 음식에 사용하지 않은 자투리는 모았다가 끓여냅니다. 그 물로 밥을 짓거나 된장국을 끓일 수도 있고, 숭늉처럼 마셔도 좋거든요. 나물을 삶고 데칠 때도 한 번 쓴 물을 계속 씁니다. 나물을 무치거나 볶을 때 사용하는 팬도, 양념을 버무릴 때 쓰는 그릇도 이왕이면 하나만 쓰려고 해요. 과정에서부터 쓸데없는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요리 아니겠어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농사짓는 사람의 노고와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 먹는 사람의 복을 함께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소화도 잘되고, 내 몸에서 나온 것이 건강한 거름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역행하려 하니 땅이 병들고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하퍼스 바자 사찰음식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관스님 한국의 사찰음식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이어오던 음식 문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만들어온 것이니까요. 결국 사찰음식을 보존한다는 건 한국의 맛을 계승해가는 것과 같은 길이라는 거지요. 백양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사찰음식 체험을 넣은 것도, 해외에 나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조리 학교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예요. 한식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많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고유의 것을 널리 퍼뜨릴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 힘 닿는 데까지 해봐야죠.
Credit
- 사진/ 김연제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2025 겨울 패션 트렌드
#겨울, #윈터, #코트, #자켓, #목도리, #퍼, #스타일링, #홀리데이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