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TYLE
어느 피처 에디터의 하이브리드 오피스 체험기
거점 오피스에서 일해보니?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하퍼스 바자> 편집부가 속해 있는 중앙그룹은 지난해 가을부터 신사, 상암, 서소문에 네오 스테이션이라는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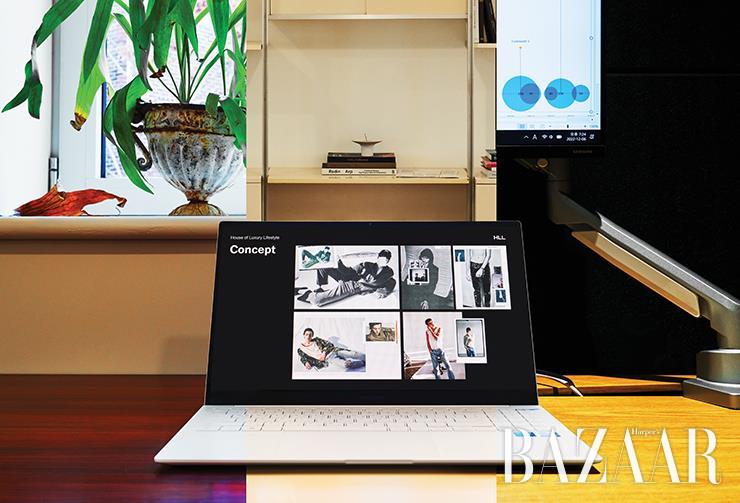 어느 피처 에디터의 하이브리드 오피스 체험기
어느 피처 에디터의 하이브리드 오피스 체험기
<하퍼스 바자> 편집부가 속해 있는 중앙그룹은 지난해 가을부터 신사, 상암, 서소문에 네오 스테이션이라는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마포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신사동 사무실로 급히 이동해 화보 시안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4차선 도로가 거대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입 안이 바짝 말랐다. 불현듯 얼마 전 회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점 오피스가 떠올라 핸들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나는 마포와 가까운 상암동 네오 스테이션에서 시안 작업을 시간 내에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촬영장에서 만날 스태프들에게 눈이 오니 내일 출근길을 조심하라는 다정한 리마인드 문자까지 남겼다. ‘내 자리’가 아니라 불편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입실 시 키오스크에서 자신의 좌석을 예약하고 퇴실 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너저분한 잡동사니가 쌓일 틈이 없다. ‘내 자리’보다 깨끗한 공유 데스크에선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춤을 추듯 절로 움직였다. 사무실도 집도 아닌 낯선 공간이 주는 영감이랄까. 이래서 사람들이 재택근무 기간에도 그토록 카페를 찾아 다닌 거겠지. 그럼에도 카페와 달리 사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복합기 사용은 물론이고 VPN 우회 접속의 찜찜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소리다. 해외에서 공유 와이파이 한번 잘못 썼다가 SNS 해킹 당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내게는 빛과 소금 같은 업무 환경이랄까. 가장 의외였던 한 가지.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저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칼퇴를 기다리거나 딴짓으로 시간을 때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눈 오는 12월 어느 오후, 열 명 남짓한 사람들 모두 눈 내리는 창밖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 조용히 집중한 상태였다. 아, 이래서 후지쯔가 기존의 사무실을 50%나 줄이고 거점 오피스를 확대한 거구나, 이래서 아마존이 14억 달러나 투자해서 댈러스와 디트로이트, 덴버, 뉴욕, 피닉스, 샌디에이고 등 6개 도시에 거점 오피스를 지은 거구나.
경기도에 사는 내가 <바자> 편집부가 속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데 드는 시간은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30분씩 왕복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고 한 달이면 75시간이며 1년이면 9백 시간이다. 하루 24시간씩 31일을 쓰고도 남는 시간을 오직 일하러 가는 와중에 길가에서 버리는 것이다. 나에게 하루 3시간이라는 인저리 타임이 주어진다면 이 경기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네오 스테이션을 경험한 뒤로 꽉 막힌 강변북로 출근길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우리 동네에 거점 오피스가 생긴다면? 어쩌면 아직 답장하지 못한 이메일에 조금 더 사려 깊은 회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일 인터뷰할 배우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적어도 한 작품 정도는 더 챙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지개 한 번, 커피 한 잔만큼의 작은 여유라도 좋다. 뭐가 됐든 나의 일상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행복 지수가 감소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분당 5천6백53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통근 시간이 1시간인 직장인의 행복상실가치가 월 94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거점 오피스가 기존의 출근을 완벽히 대체하진 못할 것이다. 코로나를 거치며 모두가 실감했듯 대면 소통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다만 알게 된 것이다. 더 이상 한 장소에서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일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나에겐 세 가지의 선택지가 생겼다. 이제는 월 94만원어치의 행복을 덜 잃을 수 있도록 약간의 분산 투자가 가능한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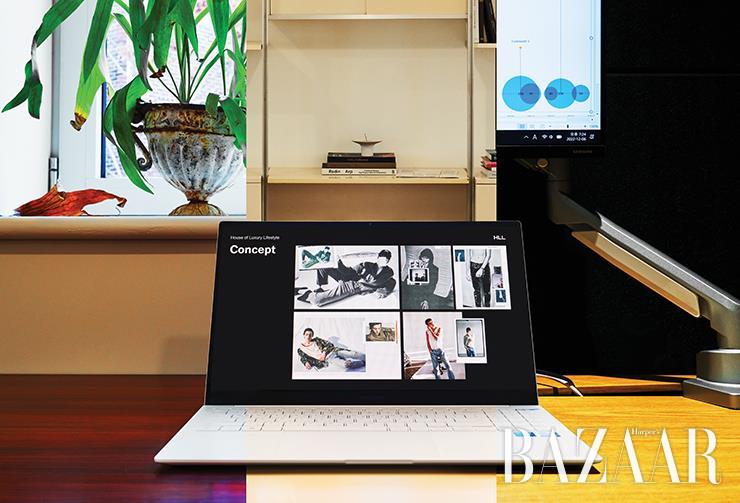
File 4.
<하퍼스 바자> 편집부가 속해 있는 중앙그룹은 지난해 가을부터 신사, 상암, 서소문에 네오 스테이션이라는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마포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신사동 사무실로 급히 이동해 화보 시안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4차선 도로가 거대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입 안이 바짝 말랐다. 불현듯 얼마 전 회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점 오피스가 떠올라 핸들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나는 마포와 가까운 상암동 네오 스테이션에서 시안 작업을 시간 내에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촬영장에서 만날 스태프들에게 눈이 오니 내일 출근길을 조심하라는 다정한 리마인드 문자까지 남겼다. ‘내 자리’가 아니라 불편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입실 시 키오스크에서 자신의 좌석을 예약하고 퇴실 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너저분한 잡동사니가 쌓일 틈이 없다. ‘내 자리’보다 깨끗한 공유 데스크에선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춤을 추듯 절로 움직였다. 사무실도 집도 아닌 낯선 공간이 주는 영감이랄까. 이래서 사람들이 재택근무 기간에도 그토록 카페를 찾아 다닌 거겠지. 그럼에도 카페와 달리 사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복합기 사용은 물론이고 VPN 우회 접속의 찜찜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소리다. 해외에서 공유 와이파이 한번 잘못 썼다가 SNS 해킹 당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내게는 빛과 소금 같은 업무 환경이랄까. 가장 의외였던 한 가지.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저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칼퇴를 기다리거나 딴짓으로 시간을 때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눈 오는 12월 어느 오후, 열 명 남짓한 사람들 모두 눈 내리는 창밖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일에 조용히 집중한 상태였다. 아, 이래서 후지쯔가 기존의 사무실을 50%나 줄이고 거점 오피스를 확대한 거구나, 이래서 아마존이 14억 달러나 투자해서 댈러스와 디트로이트, 덴버, 뉴욕, 피닉스, 샌디에이고 등 6개 도시에 거점 오피스를 지은 거구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 근무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효율성과 생산성의 이점을 눈치 챈 기업들이 기꺼이 그 바람을 실행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착취나 사보타주가 아닌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다.
경기도에 사는 내가 <바자> 편집부가 속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데 드는 시간은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30분씩 왕복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고 한 달이면 75시간이며 1년이면 9백 시간이다. 하루 24시간씩 31일을 쓰고도 남는 시간을 오직 일하러 가는 와중에 길가에서 버리는 것이다. 나에게 하루 3시간이라는 인저리 타임이 주어진다면 이 경기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네오 스테이션을 경험한 뒤로 꽉 막힌 강변북로 출근길에서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우리 동네에 거점 오피스가 생긴다면? 어쩌면 아직 답장하지 못한 이메일에 조금 더 사려 깊은 회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일 인터뷰할 배우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적어도 한 작품 정도는 더 챙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지개 한 번, 커피 한 잔만큼의 작은 여유라도 좋다. 뭐가 됐든 나의 일상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행복 지수가 감소하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분당 5천6백53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통근 시간이 1시간인 직장인의 행복상실가치가 월 94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거점 오피스가 기존의 출근을 완벽히 대체하진 못할 것이다. 코로나를 거치며 모두가 실감했듯 대면 소통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다만 알게 된 것이다. 더 이상 한 장소에서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일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나에겐 세 가지의 선택지가 생겼다. 이제는 월 94만원어치의 행복을 덜 잃을 수 있도록 약간의 분산 투자가 가능한지도 모른다.
Credit
- 에디터/ 손안나, 안서경
- 사진/ 이현석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2025 겨울 패션 트렌드
#겨울, #윈터, #코트, #자켓, #목도리, #퍼, #스타일링, #홀리데이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