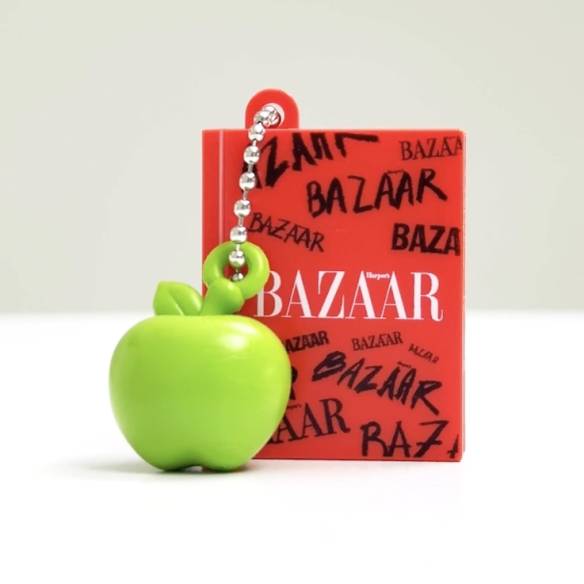SUSTAINABILITY
타임지 커버에 실린 불 타버린 세계지도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나 기후비상사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시대. 그렇다 보니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말레이시아 아티스트 홍 이의 설치미술 작품을 보고 나면 어떤 기시감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폭염이나 한파, 가뭄 등의 기후재난은 기우가 아닌 현실이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불에 활활 타는 산과 들과 집들, 폭우나 허리케인, 가뭄으로 폐허가 된 어떤 도시의 풍경을 뉴스에서 망연히 지켜봐야 할 때가 있다. 지난 4월 말에 공개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통해서 그보다 더 비참한 미래를 마주하게 된다. 표지 이미지는 말레이시아의 예술가 홍 이(Hong Yi, 활동명은 Red)와 그의 팀원들이 수만 개의 초록색 성냥으로 그려낸 세계지도를 촬영한 것으로, 성냥개비는 촬영 도중 스태프들의 손에 들린 횃불에 의해 순식간에 불타버린다. 이 과정은 영상으로도 촬영되어 <타임>지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됐다. 작업을 리드한 홍 이는 말한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위기’로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기후변화’라는 주제 하에 <타임> 표지 작업에 참여하게 됐나요?
두 달 전 <타임>지에서 먼저 해당 주제로 작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3년 전 스트리트 아티스트 켄지 차이(Kenji Chai)와 협업한 작품 <Burn>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었죠. 그런 다음 <Burn>을 작업할 때처럼 성냥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세계지도나 지구본 이미지를 구상하는 것으로 뜻을 맞췄고요. 참고로 <타임>지는 이번 작업으로 팬데믹과 같은 위기를 두고 온 세계가 씨름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또한 이와 같은 급의 위기이며 다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어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콘셉트를 선보인 적이 있군요. <Burn>에 대해 더 설명해주세요.
아마존과 보르네오섬에서 일어났던 산불을 주제로 만든 작품이었어요. 켄지 차이는 오랑우탄 두 마리를 그렸고, 저는 그 주변을 성냥개비로 만든 나무로 채웠죠. 그런 다음 이번처럼 작품을 불태웠어요. 결론적으로 오랑우탄 두 마리가 검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작업에 참여한 6명의 메인 팀원도 궁금해요.
건축학 전공자 4명과 제품 디자이너 1명, 고등학생 인턴 1명으로 구성됐어요. 건축학 전공자 중 한 명은 <타임> 표지 사진의 촬영을 담당했죠. 참고로 저도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 모두가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책임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이 점이 흥미로웠어요. 모두가 주제에 집중했고, 기후 문제를 조사했으며,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했죠. 2주 동안 매일 8시간씩 성냥개비를 보드에 꽂으면서 말이에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더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초반에 다양한 방법으로 몇 차례 모크업(Mock-up)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풀로 합판에 성냥개비를 붙이는 것이 첫 번째 시도였죠. 한데 이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합판에 사전 천공(Predrill)을 한 다음 거기에 성냥개비를 꽂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불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했는데요. 노력의 결과로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면서 불기둥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보드에 난연성 페인트를 여러 겹 칠한 뒤 45도 각도로 세우게 됐어요. 또 디지털 시안 작업을 거치면서 각 성냥개비의 평균 거리값과 적당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알게 됐죠. 최종 버전은 3.3×2.2m로, 레이저로 커팅한 여덟 조각의 합판으로 구성됐어요. 이 보드의 앞뒤에 2~3겹의 흰색 발화 지연 페인트를 칠한 뒤, 그 위에 발화지연제를 바른 목재판을 덧붙였고요. 최종적으로 방화 코팅을 뿌리기 전에 판과 판 사이의 틈을 완전히 메우는 것도 일이었죠. 이렇게 완성한 보드에 전부 다른 높이로 자른 성냥개비를 하나하나 손으로 꽂았어요.
녹색 성냥개비가 쓰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두에게 익숙한 세계지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녹색 성냥개비들로 나무를 표현했죠. 한데 말레이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개비는 대부분 갈색이어서 녹색으로 커스텀 제작해야 했어요.
이번 작품의 제목 <Climate is Everything(기후는 모든 것)>의 의미도 궁금해요.
“Climate affects all of us, one of us is affected, all of us are affected(기후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중 한 명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작품은 온라인에서 영상으로도 감상할 수 있죠. 세계지도를 불태워버리는 퍼포먼스를 <타임> 표지를 위한 사진과 더불어 영상으로도 담은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성냥개비로 작품을 만들고, 이것을 불태웠을 때 기회의 창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단 몇 초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부분적인 동기로는 인간이 지구를 변화시켰다는 진실과의 유사점도 분명하게 그려내고 싶었어요. 인간은 우주적 규모에서 단 1/1000초 남짓 존재하면서 지구를 무참히 파괴했고, 퍼포먼스는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의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죠.
온전한 지구에 불이 붙기 직전의 상황을 <타임> 표지를 위한 최후의 한 장면으로 고르기까지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몇 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그중 모든 것이 불타버린 이후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의 긴급함뿐만 아니라 상실과 희망의 느낌을 동시에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최종 이미지를 골랐죠.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지구를 기억해야 하고, 모두가 파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희망과 회복력, 협동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작품이 불에 활활 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긴장감, 불안함, 약간의 두려움,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어요. 은유적으로 불타버린 세계를 목격한 것도 그렇지만, 수개월 동안의 일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모두가 처음부터 순식간에 끝나버릴 일이란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은 우리가 정확히 계획하고 있었던 효과이기도 해요. 참고로 첫 번째 성냥개비에 불이 붙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수천 번의 카메라 셔터음을 들었을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기후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를 기후비상사태나 기후위기로 바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지해야 하죠. 그리고 저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선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요. 스튜디오에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기 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s)’을 실천 중이고, 탄소발자국을 상쇄하기 위해 ‘OneTreePlanted.org’에 나무 1백 그루도 기부했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노력이 더 유용하다고 봐요. 다수가 청원운동을 통해 기업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익에서 환경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요구해야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해지면 기후위기를 이겨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Credit
- 에디터/ 손안나
- 글/ 김수정(프리랜스 에디터)
- 번역/ 백세리
- 사진/ Annice Lyn,Jessie Lyee
- 웹디자이너/ 한다민
이 기사엔 이런 키워드!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