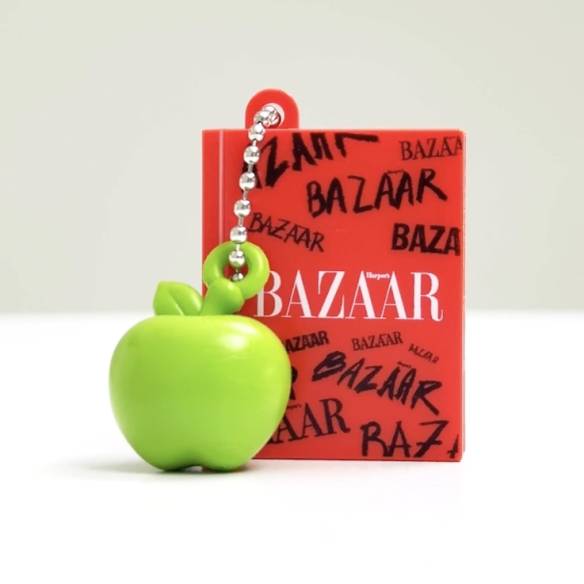SUSTAINABILITY
패션이 쓰레기가 될 때
과잉소비와 과잉생산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식민주의가 퍼지고 있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야말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매주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한다. 철저한 분리수거로 양심의 가책을 덮어보려 하지만 이도 정답은 아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들의 여정을 확인하면 우리가 과연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아찔할 정도로 참혹하다. 많은 쓰레기는 우리나라를 떠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팔려나간다. 인도에는 3천1백 개의 쓰레기 산이 있다. 수십 년째 쌓인 쓰레기들은 이미 과포화 상태. 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 생기는 메탄 가스로 인해 큰 불이 나는 것도 일상이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됐다. 인도에서만 쓰레기를 삼켜 죽는 소가 연간 1천 마리에 달한다. 실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죽어가는 소를 치료하기 위해 내장을 열자 그 속에서 90kg에 달하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나왔다. 그 사이로 얼핏 보이는 우리나라 라면 봉지. 편리하다고, 바쁘다고 쉽게 먹고 버린 라면 봉지가 소에게 어떤 일을 벌인 건가. 쓰레기 수입국은 인도 이외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가나 등 대개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이다. 그 어려운 나라 안에서도 제일 약한 것부터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 처음은 자연이었고, 두 번째는 동물이다. 인도의 소와 같은 일은 스리랑카의 코끼리에게서도, 방글라데시의 소에게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 중에서 제일 약한 어린이와 여자들이다. 거대한 쓰레기장이 지구 곳곳에 생기고 있고 그건 마친 인간 몸에 생긴 암 덩어리와 같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눈에 보이고 이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쓰레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로 패션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우리는 소위 ‘울트라 패스트 패션’으로 불리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패션소비시대에 살고 있다. 비단 패스트 패션만의 일이 아니다. 럭셔리 패션도 마찬가지로 온갖 캡슐 컬렉션을 껴 넣으며 일 년 내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70억 명이 사는 지구에서 한 해 1천억 개의 옷이 생산된다. 그야말로 과잉소비, 과잉생산인 것이다. 그 다음 과정은 당연히 버리는 일이다. 일 년간 생산된 옷의 33%, 즉 3백30억 개가 같은 해에 버려진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린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헌 옷 수거함에 옷을 버린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버릴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담긴 행위다. 그때와는 죄책감의 농도가 조금은 다르다. 놀라운 착각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의 헌 옷을 수출하는 국가다(무역 통계 사이트 UN COMTRADE, 2021년 기준). 앞선 네 나라와 인구수를 놓고 비교하면 독보적인 1위라 할 만하다. 그렇게 덜 죄책감을 느끼며, 헌 옷 수거함에 넣은 옷들은 단 5%만이 국내에서 소화되고 나머지는 ‘카야예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 아크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로 팔려나간다. 한국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가나 사람들.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할 때다. “북반구의 패스트 패션, 과잉생산, 과잉소비 때문에 여기 아크라로 많은 옷이 온다. 사람들은 팔릴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입을 양보다 더 많이 구매한다. 그러다 보니 그 옷들을 배출한 곳이 필요하게 된다. 중고 의류 거래가 바로 그 배출구가 된 셈이다. 많은 사람은 헌 옷이 자선 사업에 사용되거나 재활용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헌 옷의 대부분은 이곳에 온다.” 환경운동단체 OR의 엘리자베스 리켓 대표의 말은 사실이다. 아크라의 칸타만토 중고시장에는 일주일에 한 대씩 컨테이너가 도착한다. 그 안에는 전 세계에서 온 헌 옷들이 쌓여 있다. 가나의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인데, 그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1천5백만 개의 옷이 매주 이곳으로 온다. 누가 봐도 이건 쓰레기가 될 운명이다.

헌 옷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행해야 할 것과 기업이 나서야 할 일 모두 명명백백히 밝혀져 있다.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생산을 조절해 재고를 없애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극은 여기에도 존재한다. 경고의 화살이 우리 코앞을 스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로맹 가리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는 언제나 고장난 문명의 첫 번째 신호”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도 높이를 갱신 중인 쓰레기 산, 그 속에 쌓인 건 쓰레기라 불리는 우리의 욕심이다. 과연 다음은 그 욕심이 누굴 공격할지, 이 또한 우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Credit
- 프리랜스 에디터/ 김민정
- 사진/ Getty Images
- 참조/ 환경 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