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붉고 푸른 마크 로스코의 색채가 보낸 메시지
누군가에게 부치는 사사로운 편지와도 같은 마크 로스코의 색채에 대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아들 크리스토퍼와 딸 케이트와 나눈 대화.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Mark Rothko, <No. 16 [?] {Green, White, Yellow on Yellow}>, 1951, Oil on canvas, 171.8x113.3cm, Collection of Christopher Rothko.](/resources/online/online_image/2024/08/26/594d53c4-c59f-4ae2-9e69-3e58df2c64ba.jpg)
Mark Rothko, <No. 16 [?] {Green, White, Yellow on Yellow}>, 1951, Oil on canvas, 171.8x113.3cm, Collection of Christopher Roth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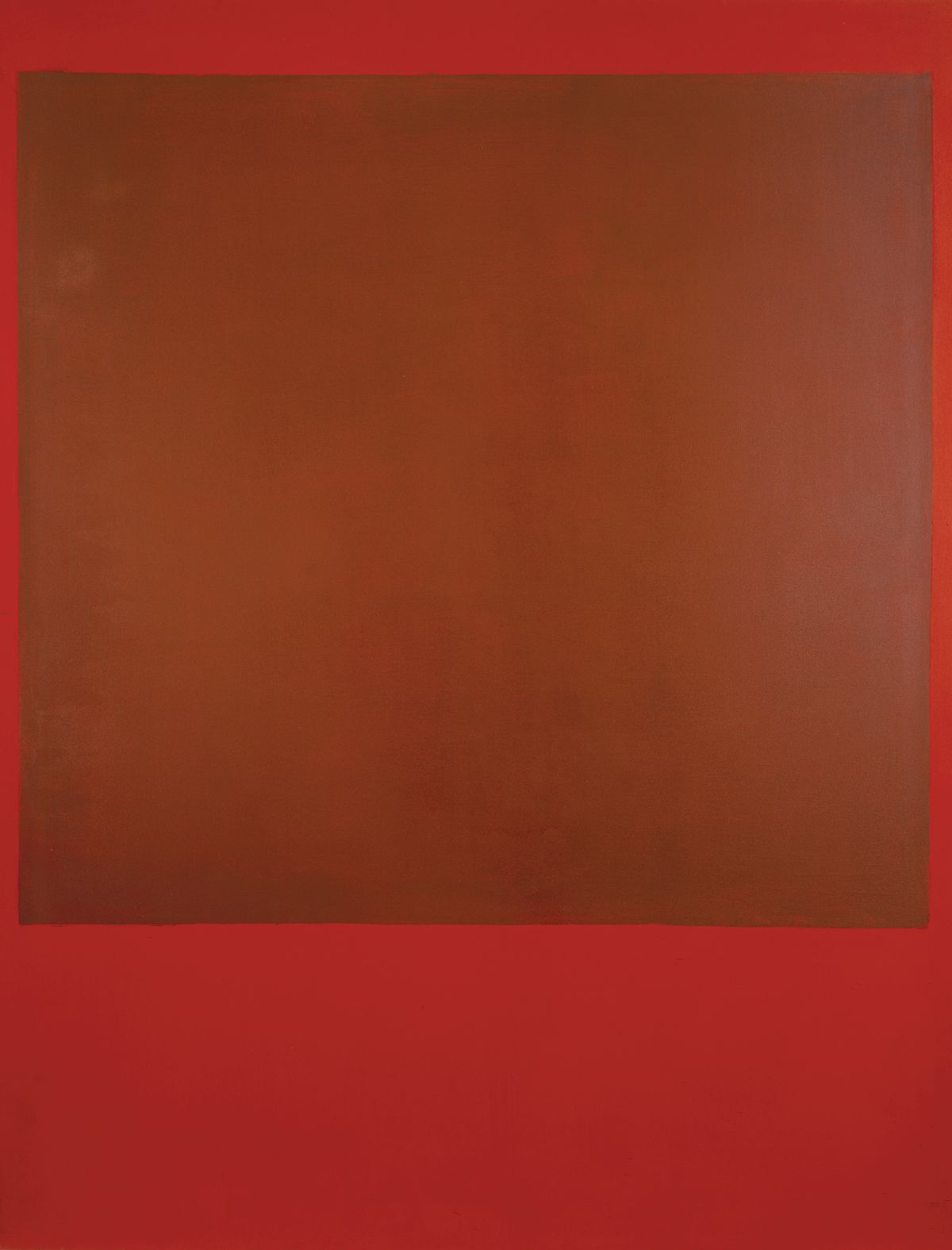
Mark Rothko, <Untitled {Brown on Red}>, 1964, Oil on canvas, 228.6x175.3cm, Collection of Kate Rothko Prizel.
로스코의 강렬한 색채와 이우환의 절제하는 듯한 색과 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관람객을 사색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색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가의 어떤 상호작용에 주목했나요? 크리스토퍼 두 작가의 차이점으로 짚어주신 부분은 그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한 직후의 작품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렬한 색채를 활용한 이우환의 작품과, 절제된 색상과 대비가 돋보이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동시에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색의 상태를 끌어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전시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처럼 두 작가의 공통점과 대조되는 부분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편지, 서신을 뜻하는 ‘Correspondence’를 전시의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제목으로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크리스토퍼 이 제목은 이우환 작가가 제안한 것입니다. 듣자마자 바로 동의했어요. 단어는 편지 형태의 양방향 소통을 뜻하기도 하지만, 두 작가의 유사성이나 시간과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건드려 무언가를 느끼게 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관객과 대화하길 원했죠.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 중 유독 내밀하게 말을 걸어온 작품이 있나요? 케이트 이번 전시에서 가장 친밀하게 다가온 작품은 <Black and Gray> 연작입니다. 1969년의 작품인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이 시기의 작품들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어두운 색조로 그린 작품들이 아버지의 삶을 반영한다는 식으로 이해했다면, 지금은 이러한 해석이 아버지가 전달하려 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시기의 작품을 두고 내면의 불안과 어둠을 형상화했다는 시각이 많지만, 저에게는 검은색과 회색이 주를 이루는 그 무렵의 작품이 되려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작업에 몰입했다는 점에서 일견 사실이기도 한 말일 테고요. 결국 그 작품들로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케이트 사람들은 대체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밝은 색조의 작품을 가벼운 감정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고, <Black and Gray> 연작에서 정점을 이루는 어두운 색조를 불안이나 어두운 감정과 연관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색조의 변화가 밝은 작품들로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반영했을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지요. 아버지는 자신의 그림이 색채에 관한 것도, 미적 경험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자주 강조하셨어요. 그보다는 도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야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아버지의 작품을 감상하는 건 명상을 하는 행위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림을 음악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화가가 되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음악이 명상과도 같은, 영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와 함께, 2015년 크리스토퍼가 집필한 저서 <Mark Rothko : From the Inside Out>의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크리스토퍼 이 책은 제 아버지의 그림과 함께해온 지난 20여 년의 결정체입니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제게 어떻게 말을 걸어왔는지, 저는 무엇 때문에 그 그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느끼고 배운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대중적인, 혹은 학술적인 영역에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이야기를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마크 로스코의 전시를 위해, 혹은 강연을 준비하며 썼던 에세이 몇 편을 출발점 삼아 아주 천천히 준비했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은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예술에 관한 아버지와의 진득한 대화 같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아버지의 작업 스타일을 두고 은행원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더군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함께했던 아버지,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는 어떤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케이트 아버지는 보통 아침 9시쯤 작업실로 출발하셨고, 저녁 6시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셨어요. 토요일에는 종일 작업을 하셨지만, 일요일 오전만큼은 집에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셨어요. 지금 떠오르는 기억 하나는 8살 무렵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셨던 날이에요. 정작 본인도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셨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웃음)
음악 평론가로도 일했던 크리스토퍼가 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다면, 음악을 사랑했단 점일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크리스토퍼 아버지와 저는 미술보다도 음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술보다 음악에 더 반응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오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저는 ‘마술피리’를, 아버지는 ‘돈 조반니’를 선택하며 끝끝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실패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물론 두 오페라 모두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데는 완전히 동의했지만요.
우리의 시선을 앗아갈 화려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추상화에 대체할 수 없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케이트 추상 작품을 감상하는 건 곧 느리게 움직이는 세상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 단위로 움직이듯 빠르기만 한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 기반해 아버지의 전시를 찾는 관람객이 많을 거란 얘기죠. 로스코의 작품 안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교감을 나누다 진정한 이해에 다다르는, 조용한 명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 ≪Correspondence: Lee Ufan and Mark Rothko≫전은 페이스갤러리 서울에서 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린다.
고영진은 <바자>의 피처 에디터다. 마크 로스코와 이우환의 전시를 감상할 그 어느 날엔 가능한 전시장에 오래 머무르며 느릿한 시간을 보내겠다 다짐했다.
Credit
- 사진/ © 1998 Kate Rothko Prizel and Christopher Rothko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디자인/ 이예슬
- 디지털 디자인/ GRAFIKSANG
Celeb's BIG News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BTS, #NCT, #올데이 프로젝트, #에스파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하퍼스 바자의 최신소식
















